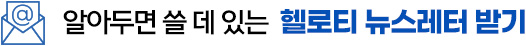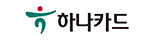기술은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TECH온앤오프]는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유즈 케이스 기반 스토리텔링 시리즈입니다. 기술 도입 전의 고민과 한계, 도입 과정 그리고 변화 이후의 놀라운 성과까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기술이 어떻게 경험을 바꾸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러한 가치를 TECH온앤오프에 담아봤습니다.
[세 줄 요약]
1. 범죄 수사 기술의 발전은 높은 비용과 접근성 한계를 지닌 기존 시스템을 대체
2. AI 기반 수사 인프라는 맞춤형 정서 대응처럼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추적
3. AI는 디지털 포렌식, CCTV, 위치정보 기반 수사와 결합해 조기 탐지와 예측 대응이 가능
OFF : 공포로 뉴스를 장식했던 '연쇄살인범'들의 이름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TV뉴스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 연쇄살인범들의 이름이 톱을 장식하곤 했다. 모두가 기억할만한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이다. 이들은 범행의 수법, 장소, 대상을 달리하며 수년에 걸쳐 여러 명을 살해했다. ‘연쇄살인범’나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일상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때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범죄를 저지르던 시기, 이들을 잡기 위한 경찰 수사는 범죄 현장 중심의 탐문과 물증 분석에 의존했다. 사건 예방을 위한 CCTV는 한정적이었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역시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급변했다. 더 이상 ‘연쇄살인범’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물론 강력범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특정 인물이 수개월·수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은 급격히 사라졌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범죄자가 연쇄적으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는 사회적·기술적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수사 시스템이 범죄 발생 직후부터 용의자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추적하는 환경이 된 것이다. 그 안에는 인공지능, CCTV, 위치정보, DNA 분석 같은 기술의 진화가 있다.
ON : 수사기술의 고도화, 연속범죄라는 악의 사슬을 끊다
현재 한국 경찰은 CCTV 영상의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차량과 인물 동선을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얼굴 인식, 번호판 식별, 통신기록 분석 등 각종 데이터는 범죄 발생 시점부터 자동 수집되고, 용의자 탐색 알고리즘이 이를 연결해 실시간 수사망을 구축한다. AI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경찰청은 시범적으로 AI 기반 순찰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범죄 발생 확률을 산출하고 있다. 위험 지역에는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로 인해 실제 범죄율 감소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AI를 통한 수사기술의 고도화는 단순 감시를 넘어 예방 단계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법무부도 AI 기반 재범 위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출소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AI는 수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치안 자원 최적화와 사전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연쇄범죄의 종말, 기술이 만든 변화
연쇄살인의 감소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요인의 결과다. 무엇보다 범죄자가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며 오랫동안 숨어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다. 전국에 구축된 CCTV, 실시간 위치 추적, 통합 포렌식 시스템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자를 감시하고 추적한다.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다 보니 범죄자는 재범을 시도할 여유조차 갖기 어렵다.
또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로 시민 제보와 신고 시스템도 실시간화되었다. 수상한 인물의 이동, 이질적인 행동 하나도 빠르게 공개되며 공동체 전체가 치안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과거처럼 범죄자가 숨어다니며 연쇄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었던 구조 자체를 붕괴시켰다.
여기에 AI가 더해지며 범죄의 실시간 탐지, 자동 분석, 예측 대응이라는 고도화된 범죄 대응 체계가 완성되어가고 있다. 범죄의 패턴은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범죄, 성착취물 유통 등 디지털 기반 범죄로 이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활용한 추적·탐지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
반복 범죄의 사라진 시대, AI는 조력자 역할
하지만 분명히 해야할 부분이 있다. 결국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는 것은 사람이 한다. AI는 어디까지나 연쇄강력범죄를 직접 막는 방패라기보다는, 디지털 수사 인프라의 지능화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CCTV,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위치 기반 추적 같은 기술들이 만들어낸 고도화된 치안 환경 속에서 AI는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반복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했던 시간의 여유와 수사의 허점을 AI가 지워내고 그 틀 안에서 수사인력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범죄는 결국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다. 그 중심에는 기술이 있고 AI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감시자이자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