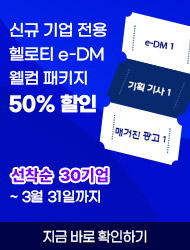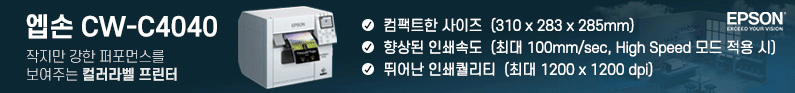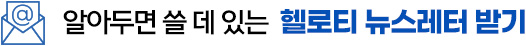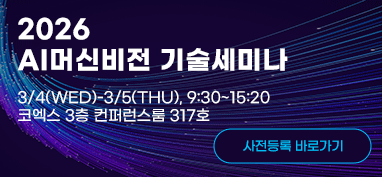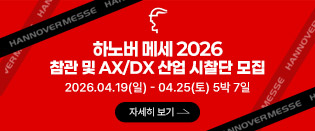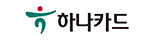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이 교차하는 지점은 단일 기술적 흥밋거리가 아니다. 인구 절벽, 노동시장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오늘날 산업은 이처럼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기계는 산업 경쟁력의 생존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로봇과 AI의 융합을 논하는 자리는 학계의 학술 교류나 스타트업의 데모 무대의 의미를 넘어선다. 사회와 경제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는 전략적 어젠다의 장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서울 삼성동 전시장 코엑스에서 열린 ‘오픈 로보틱스 AI 포럼 코리아(Open Robotics AI Forum Korea)’는 로보틱스와 AI의 미래 지형을 가늠하는 글로벌 무대로 주목받았다. 해당 포럼은 미국 지능형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 업체 ‘오픈마인드(OpenMind)’, 한국 AI 기반 안전·보안 솔루션 기술 업체 ‘에임인텔리전스(AIM Intelligence)’, 한국 AI 연구·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업체 ‘어텐션엑스(AttentionX)’ 등 세 개사가 손잡고 마련했다.
포럼에는 AI·로보틱스·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전문가·연구자·투자자가 대거 참여해 탈중앙화 AI와 오픈소스 기술이 이끄는 차세대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을 필두로,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배송 로봇까지 현실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여기에 자율 에이전트의 보상 메커니즘, 분산 지능 인프라, 로봇 보안·안전 등 구체적 어젠다 또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자본 흐름과 산업 생태계 변화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낸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로보틱스 혁신의 전면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지컬 AI(Physical AI), '인구 절벽 시대' 제조업의 해법

“AI는 단지 상자 속 뇌(Brain in the box)가 아닙니다. 진짜 지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죠”
얀 리프하르트(Jan Liphardt) 오픈마인드(OpenMind) 창립자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이번 포럼에서 피지컬 AI(Physical AI)를 AI 영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일본이 직면한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결부해 로봇·AI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상자 속에 갇힌 두뇌’라고 규정했다. 언어·문자 중심의 모델이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상호작용과 맥락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이후, 진정한 AI는 실제 물리 세계에서 로봇을 통해 행동·학습하는 ‘피지컬 AI’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의 발표 기조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였다.
그는 구체적 사회경제적 근거를 들어 관련 이슈를 부각했다. 일본은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했으며, 한국 또한 빠른 속도로 동일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노동 공급 충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가 언급한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다(Labourers are vanishing)’는 문장은 정책·산업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프하르트는 로봇·AI 결합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obotics Foundation Model, RFM) 개발이다. 그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 지능을 ‘시스템 1(System 1)’과 ‘시스템 2(System 2)’로 세분화했다. 시스템 1은 반사적·운동 제어, 시스템 2는 추론·계획이다.
CEO는 “시스템 1은 단순 제어일 뿐 지능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단언하며, “단순 관절 제어나 비례·적분·미분(P·I·D) 제어 수준을 넘어, 맥락 판단·장기 계획·추론 능력을 갖춘 시스템 2 수준의 모델이 탑재된 로봇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데이터 형태와 학습 파이프라인에 대한 논의도 상술했다. 리프하르트는 언어적 서술과 물리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강조하며 “전자레인지를 여는 것과 노트북 여는 것은 언어적으로 같지만 상호작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점은 3차원(3D) 공간 정보에 시간 축을 더한 ‘4차원(4D)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실제 작업자의 동작·힘·촉각·관성 등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봇의 시각·힘·자기인식(Vision·Force·Proprioception)을 다루는 센서 융합 기술 또한 핵심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도메인 랜덤화(Domain Randomization), 시뮬레이션·현실 전이(Simulation to Reality, Sim2Real) 등 시뮬레이션 학습 기법을 결합해 현실적 성능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생태계 이슈도 그의 연설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소위 '범용 제어 모델(General Model)'을 통해 수십 자유도(DoF)의 로봇 핸드부터 산업용 로봇 팔, 자율주행로봇(AMR)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지다.
그는 이 모든 로봇을 제어하는 범용 모델을 표준화·오픈 API·하드웨어 어댑터 등으로 구축 가능하다는 전망을 전했다. 이를 통한 생태계 설계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여러 국내 로봇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50DoF 로봇 핸드의 시연에 성공했다고 언급하고, 실증 결과를 덧붙였다.
경제·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미래상을 제시했다.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노동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이라며 로봇이 노동을 수행하는 ‘서비스 유닛’이라고 미래상을 정의한 후, ▲로봇 기업 및 운영자 모델의 등장 ▲로봇의 자본·자산화 ▲로봇 유닛 금융 모델 등 새로운 사업 구도의 등장을 예견했다.
그는 또한 “사람뿐 아니라 로봇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산업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의 높은 특허 생산성과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우리 로봇 제조 업체를 거론하며, 동아시아 제조업 재편의 중심에 한국이 설 수 있음을 역설했다.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인간 손의 섬세함을 향한 도전

“로보틱스의 다음 도약은 모델 그 자체입니다(The next leap in robotics is in the models themselves)”
류중희 리얼월드 CEO는 로봇 손의 기술 현황을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인간 손의 구조적·기능적 복잡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인간 손은 27개 관절과 수십 개 근육이 정교하게 협업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모터·센서 등 하드웨어를 더 늘리는 접근으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함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가 제시한 해결책은 ‘파운데이션 모델’ 방법론을 로보틱스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는 언어 모델의 성공을 비유로 들며 “언어 모델이 수십억 문장을 통해 문맥을 이해했듯, 로봇도 수십억 개의 상호작용을 학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상호작용 데이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힘·접촉·관성(inertia) 등 물리적 변수까지 포함하는 고차원적 신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산업적 응용 관점에서도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물류창고에서의 박스 핸들링, 전자제품 조립의 정밀 조작, 의료용 로봇의 섬세한 도구 조작 등에서 ‘맥락적 손동작(Contextual Dexterity)’이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장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확장하는 데이터 수집 전략, 라벨링·자기주도 학습 기법, 도메인 적응(Domain Adaptation)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실무적 난제를 논했다.
다른 한편, 그는 기술적 한계보다 ‘규모의 한계’를 또 다른 해결 지점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기술적 한계라기보다 스케일의 한계(The limits of scale)”라며 “수십억 상호작용을 모으고 처리할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산학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이 제조 강국으로서 가진 강점인 공장 인프라, 제조 데이터 등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결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표준화와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했다.
"오픈소스는 로보틱스 혁신의 가속기"
“오픈소스는 로보틱스를 민주화하고 있습니다(Open source is democratizing robotics)”
임요셉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교수는 오픈소스의 역할을 ‘기반 인프라’ 관점에서 풀어냈다. 그는 ROS가 글로벌 로보틱스 분야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요셉 부교수는 “ROS는 로봇 공학계의 리눅스(Linux)”라며 오픈소스가 기존의 코드 공개 형태를 넘어서고 있고, 플랫폼적인 표준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오픈소스가 산·학 협력과 기술 확산을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제어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 스타트업이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안정적 구현체를 표준으로 채택해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곧바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될 수 있다”고 선순환의 본질을 피력했다. 또 그는 특히 RFM과 오픈소스의 결합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LLM이 공개되자 다양한 파생 연구가 폭발적으로 나왔듯, 로봇 기초 모델도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다.
반면 “폐쇄형 모델은 특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하나,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초 모델 공개, 데이터셋·시뮬레이션 환경 표준화, 오픈 라이선스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또한 그는 오픈소스가 가져오는 사회적·정책적 효과도 소개했다. 오픈소스 생태계는 투명성·재현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자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므로 기술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이 이 생태계에서 점점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제조업 역량의 결합이 한국을 ‘오픈소스 로보틱스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연구·산업·규제기관이 협력해 데이터·인프라를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참여를 촉진하는 공적 투자·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은 벽 안에서가 아니라 공유·협력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봇 가드레일 구축, 피지컬 AI를 우리의 통제 하에 두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인간을 지키는 울타리로 로봇을 배치하는 것입니다(What we want is not perfect freedom, but guardrails for humans)”
히스키아스 딩게토(Hiskias Dingeto) 에임인텔리전스 선임연구원은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안전·윤리·통제 문제를 기술적·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뤘다. 그는 특히 ‘행동하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위험 요소인 모델 기만(Model Deception), 샌드배깅(Sandbagging), 스케일된 행동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사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범적 접근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강조했다.
실천적 대안으로 그는 다층적 가드레일 설계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물리 단계에서 센서·액추에이터 수준의 ‘물리적 한계(Physical Constraints)’를 설계해, 완전한 권한 탈취나 위험 행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단에서는 의사결정 경로 투명화, 검증 가능한 행동 사슬, 온체인 및 외부 감사 가능한 검증 기록을 유지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무엇이 왜 행동했는지를 소급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험실 알고리즘은 통제할 수 있지만, 거실을 돌아다니는 로봇은 다른 문제다”라며 AI 현실 적용의 복잡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술적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연결해 “가드레일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며 시민 참여,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공동 설계 과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로봇의 학습 데이터와 행동 로그가 공공적 가치와 충돌할 때의 윤리적·법적 처리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책임 소재 추적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과제로 명시했다.
피지컬 AI 시대 "텍스트가 아닌 실제 기계와의 결합"

“우리가 다루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기계입니다(What we are dealing with is not text, but actual machines)”
김지윤 마음AI 팀장은 피지컬 AI의 실무적 전개 전략과 ‘Sim2Real’ 전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실패는 데이터다(Failure is data)”라는 핵심 원칙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한 실패 케이스들을 학습 신호로 전환하는 체계적 파이프라인을 설명했다. 이는 시뮬레이션의 광범위한 실패 경험을 저비용으로 축적하고, 도메인 랜덤화·라벨링 자동화·자기주도학습 기법을 통해 현실 성능으로 전이시키는 방식이다.
그는 실무적·상용화 관점에서의 난제도 명확히 짚었다. ▲센서·액추에이터의 표준 부재 ▲대규모 시뮬레이션 로그의 저장·처리·거버넌스 문제 ▲사생활과 데이터 소유권 이슈 등이 상용화의 핵심 병목이라는 진단이다. 김 팀장은 “피지컬 AI를 산업에 안착시키려면 연구자·제조업계·규제기관이 함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관 협력과 표준화 작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튜닝, 도메인 적응 전략, 센서 캘리브레이션 및 데이터 증강 기법 등 기술적 디테일에 관해서도 구체적 기법을 소개했다. 실무 담당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를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텍스트 토큰이 아니라 물체와 힘, 마찰과 중력이 핵심”이라며, 기존 생성형 AI(Generative AI)와의 본질적 차이를 재차 강조했다.
가정용 로봇 보안, 사이버·피지컬 모범 사례로
“보안은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사이버적 세계가 동시에 얽힌 문제(Security is not just a software problem, but a cyber-physical one)”
신종호 LG전자 책임연구원은 가정용 로봇의 보안 문제를 실제 사건 중심으로 접근하며 현실적 위험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에서 보고된 가정용 로봇 해킹 사례들을 분석했다. 공격자가 카메라·센서·네트워크·클라우드 등 인터페이스를 조합해 복합적 위협을 만드는 ‘사이버·피지컬 공격’의 전형을 설명했다.
그는 ‘현실의 사건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다층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신종호 연구원은 ▲ROS·펌웨어 수준에서의 기본 보안 강화 ▲무선(OTA)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및 무결성 검증 ▲로봇·클라우드 간 통신의 종단 간 암호화 및 인증 메커니즘 강화 ▲민감 사용자 데이터의 로컬 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용 설계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로컬 연산이 중요하다”며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신 연구원은 보안이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용자는 냉장고보다 로봇에게 더 많은 신뢰를 요구한다”며 가정용 로봇이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 가능한 심리적·사회적 비용은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기업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및 표준 준수, 사고 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을 촉구했고, 규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