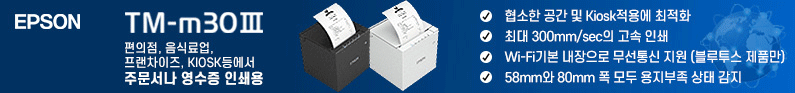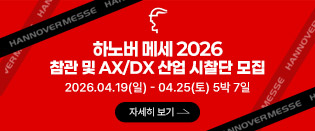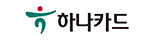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시대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상속받고 파산한다”는 블랙코미디 같은 농담까지 떠돈다. 상속세 계산기를 돌려보며 가족 단톡방이 싸늘해졌다는 이야기, 상속받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낸 뒤 남은 금액으로 다시 전세방을 구했다는 사연은 더 이상 인터넷 게시판의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다. 최근 30대 직장인 박 모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결국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을 물려받았는데 기뻐하기도 전에 국세청 문자부터 오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팔아 세금을 낸 셈이죠.”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역설. 이 아이러니 속에서 2025년 하반기, 상속세 개편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

30년째 멈춘 세법, 폭등한 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 18억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단순한 공제 한도 상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산층의 현실적 고통과 자산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문제, 세수 감소라는 국가적 부담이 얽혀 있다. 사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1996년 이후 약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6년 기준 10억 원 공제를 설계할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억 원 대였다. 지금은 12억 원을 훌쩍 넘는다. 자산 가격은 10배 넘게 뛰었고, 10억이라는 기준은 이제 평범한 중산층의 자산 규모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상속세는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가정’을 겨냥한 세금이 되었다.
해외는 완화, 한국은 초고난도 모드
해외와 비교하면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은 2025년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가 개인당 1,399만 달러, 우리 돈 약 205억 원 수준이고, 배우자 승계를 적용하면 부부는 약 4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사실상 초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이다. 상속세 자체가 없는 국가도 많다. 일본과 독일은 우리와 달리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하며, 공제 폭도 훨씬 넓다. 반면 한국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인이 ‘상속세 폭탄’을 맞기 쉬운 구조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상속세는 매우 좁고, 매우 촘촘하고, 매우 가파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속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수는 중산층이고,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구조 개편
이 문제는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 변화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확장된다. 상속세는 원래 세대 간 자산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제는 멈춰 있고 가격은 치솟고, 중산층만 옥죄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지며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결국 중산층이 겪는 상속 부담은 최소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공제 한도 18억을 놓고 벌이는 ‘숫자 싸움’이 아니다. 더 깊은 수준의 구조적 개편, 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처럼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상속이 짐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 안정성을 지키는 장치가 되도록,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중산층이 집 한 채조차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기 어려운 현실은 자산 불균형, 시장 왜곡, 정책 지연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법 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지윤 부동산전문기자/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