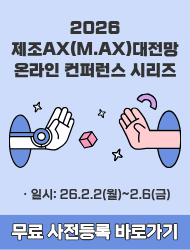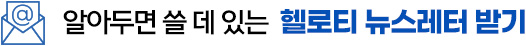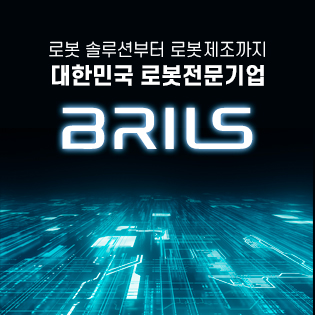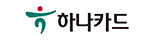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소재로 꼽히는 2차원 반도체 소재 상용화의 최대 난제였던 접촉 저항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접촉 저항을 유발하는 에너지 장벽의 이론 예측값과 실제 실험값이 불일치하는 원인을 찾아낸 것이다. 정확한 반도체 성능 예측이 가능해져 2차원 소재를 이용한 초나노 반도체 칩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UNIST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정창욱·권순용 교수팀은 2차원 반도체 소재와 바일 금속이라는 준금속이 맞닿을 때 생기는 이론적 에너지 장벽이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예측 공식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수 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칩을 만들기 위해 실리콘 대신 원자 수 겹 두께의 2차원 반도체 소재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 2차원 소재를 기존에 쓰던 금속 전극에 연결하면 전자가 잘 흐르지 못하는 접촉 저항이 심각해진다. 전자가 금속에서 반도체 소재로 갈 때 넘어야만 하는 에너지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바일 준금속은 실험적으로는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대안 소재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신뢰성이다. 기존 이론 계산에 따르면 오히려 에너지 장벽이 높게 예측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장벽이 낮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 실제로 쓰기엔 불확실성이 컸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차이는 이황화몰리브덴 2차원 반도체 소재 내부의 전도대 확장 현상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극과 반도체 소재가 특정 각도에서 맞닿으면 반도체 소재 내부의 전자 통로가 넓어지는데, 이 전자 통로가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 장벽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도 제시했다. 전도대 확장 효과와 더불어 진공준위 이동 효과도 함께 고려한 공식이다. 진공준위 이동 효과는 기존에는 그 크기가 작아 무시해도 된다고 여겨졌지만, 얇은 2차원 반도체에서는 작은 변화가 장벽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제시한 수정된 공식은 기존의 계산 공식인 쇼트키 모트 법칙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던 실험 결과를 정확히 재현했다.
정창욱 교수는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던 2차원 반도체와 준금속 계면의 에너지 장벽 형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규명한 것”이라며 “더 정확한 이론 계산식으로 최적의 소재 조합과 구조를 찾아냄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설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11월 4일 출판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