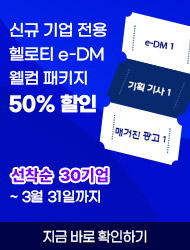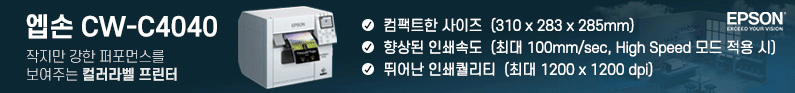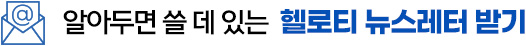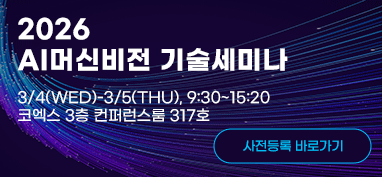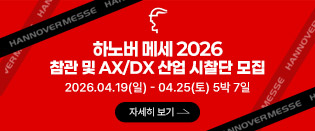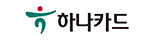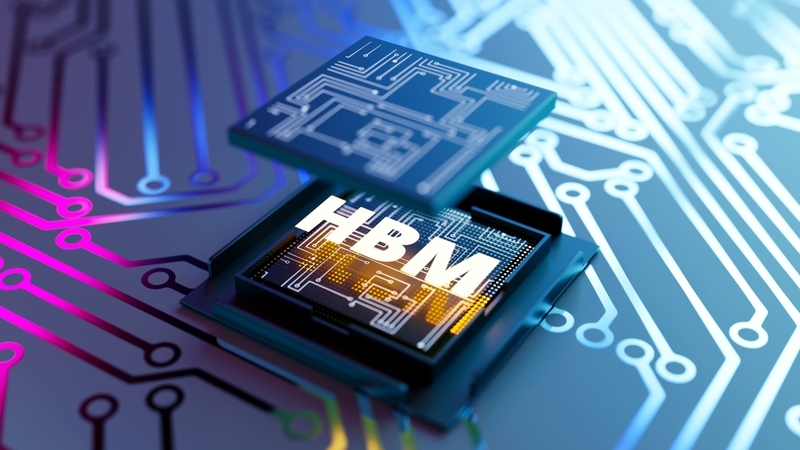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전장이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과 함께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은 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3강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HBM3E 시장에서 독주했지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12단 제품을 공급하며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급망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HBM3E 12단, 마이크론도 깃발 꽂았다
HBM은 AI 반도체의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기존 D램보다 대역폭은 56배, 전력효율은 23배 높은 동시에, GPU나 AI ASIC와 같은 고성능 칩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패키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과 추론 시, 연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서버에서는 HBM의 탑재 유무가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의 MI300 시리즈, 인텔의 가우디 3, 구글의 TPU 등 주요 AI 가속기는 모두 HBM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에 HBM 공급 능력은 단순한 메모리 제조역량을 넘어, AI 생태계의 주도권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4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GB300’용 HBM3E 12단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을 통과하고 대량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HBM3E 12단은 기존 8단 대비 용량과 대역폭을 각각 50% 이상 개선한 제품으로, 초당 최대 1.2~1.3TB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마이크론은 2025년 하반기 출하량의 대부분이 12단 HBM3E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를 공언했다.
이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엔비디아 HBM3E 공급망에 마이크론이 진입했음을 뜻한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12단 HBM3E 양산에 성공한 이후, 후발주자로 간주되던 마이크론이 1년여 만에 동급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는 평가다. 이로써 시장은 단순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고객 기반과 제품 라인업의 고도화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트렌드포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2.5%, 삼성전자가 42.4%, 마이크론이 5.1%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HBM3E 12단 공급에 성공하면서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D램 전체 시장에서도 HBM의 수요 폭증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36%, 삼성전자는 34%, 마이크론은 2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상승세는 HBM3E 8단 제품을 중심으로 초기 고객 확보에 성공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12단 제품까지 공급하면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2025년 말까지 마이크론이 HBM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은 왜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했나
삼성전자는 HBM3E 12단 개발을 2023년 중반부터 시작했지만, 생산 공정 안정성과 수율 문제로 출시가 지연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3E 개선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링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로부터의 공식 인증은 2025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말까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의 HBM 제품은 다른 고객사에 공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MD와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삼성의 HBM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의 화웨이, 바이두 등도 삼성전자의 HBM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양산보다 HBM4 개발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평택 3캠퍼스를 기반으로 HBM4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16단 적층 구조와 초당 1.5TB 이상의 대역폭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그러나 HBM3E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 발 늦은 만큼, 시장에서의 기회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업계에서는 “삼성의 후공정 라인과 EUV 기반 생산 인프라가 안정화할 경우, 중장기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3사 총력전 ‘후공정 장비부터 인재 확보까지’
HBM의 제조는 단순 D램보다 훨씬 복잡한 후공정 공정과 고부가가치 장비를 요구한다. 마이크론은 2024년부터 HBM 제조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한미반도체로부터 대량 확보해 왔다. 2025년 상반기까지 확보한 물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다. 이와 함께 대만 AUO 공장 2곳을 HBM 전용 팹으로 리모델링하고, 싱가포르에 10조 원 규모 신규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라인을 HBM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5년 6월부터 EUV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M16라인에서는 1β급 D램 기반의 고성능 HBM 양산 준비도 병행 중이다. 삼성전자 역시 평택 3라인에 HBM 공정 전용 장비를 증설하고, 인력 보강을 위한 글로벌 채용을 진행 중이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국내 엔지니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성과급 강화를 추진 중이다.
HBM은 이제 단순한 메모리 제품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선두, 마이크론의 공격적 추격, 삼성전자의 반격이 맞물리며 2025년은 ‘HBM 3파전’의 원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6세대 HBM인 ‘HBM4’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의 승기를 잡기 위한 3사의 기술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기업의 전략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고객과의 파트너십·생산 인프라·후공정 장비 역량·인재 전쟁까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HBM의 기술 진화 속도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에 달려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