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활약하고 있으며, 인력절감화나 효율화, 제조 제품의 품질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이 적용되고 있는 용도를 살펴보면, 아크 용접이나 스폿 용접과 같은 용접 용도, 제품을 들어 운반하는 반송 용도, 나사를 조이거나 하는 조립 용도, 도장 용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삭이나 연마에 사용되는 가공 용도에는 로봇 출하 대수의 몇 퍼센트 정도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공 용도의 로봇 활용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버 제거이다. 비교적 소형의 로봇 암 끝에, 소형 스핀들 모터 및 연삭숫돌 툴이나 초강철 바 등을 장착해, 금속가공품의 가공 단면 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최근 로봇의 반복 정도(교시된 동작을 반복했을 때, 각 교시 포인트의 정도 오차) 및 절대 정도(지정된 공간 좌표상의 위치에 동작할 때의 정도) 등의 향상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해, 절삭가공이나 연마가공 그리고 연삭가공에 적용한 로봇 가공 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로봇에 의한 절삭가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NC 공작기계의 대체로부터, 최근에는 가공 제품의 편차를 계측해 제품 형상에 맞춰 가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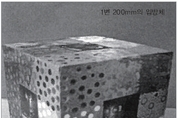
[헬로티] 요소·주변 기술로부터 본 공작기계의 진화에 대해 생각한다. 기존에는 평면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작기계의 진화가 표현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요소·주변 기술이 광범위·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그에 따라 공작기계의 진화도 3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림 1. 공작기계의 간단한 역사 (윌킨슨의 보링머신에서 3D 프린터까지) 끊임없는 가공 요구와 지금까지 공작기계 진화 그림 1에 나타냈듯이 금속가공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작기계의 역사는 산업혁명 때인 1759년에 윌킨슨의 보링머신에서 시작된다. 그 후 가공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그림 1 ※ 표시)에 의해 무겁고 두꺼우며 길고 큰(중후장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선반, 밀링머신 등 여러 종류의 매뉴얼 조작 공작기계가 개발됐다. 그 후 1952년의 NC 밀링머신 개발에 이어, 1958년에는 머시닝센터가 개발되어 단숨에 자동화가 가속됐다. 또한, 절삭·연삭 이외의 가공으로서 방전가공·레이저 가공·워터젯 등의 특수가공용 공작기계도 개발되어 가공 형태가 확장됐다. 이러한 공작기계에 의해 가볍고 얇으며 짧고 작은(경박단소

[첨단 헬로티] 최근 산업용 로봇의 사용법이 변화해 왔다. 머티어리얼 핸들링이나 용접이 대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회전공구를 사용한 밀링을 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다. 이상은 높고 NC 공작기계를 대신해 로봇으로 정도 좋은 밀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말하면, 로봇‘만으로는’ 공작기계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봇은 반복 정도는 있지만, 이동 간의 직진 정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조상 6개의 모터를 구사해 직선운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직동축의 NC 공작기계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구조상의 문제 외에 산업용 로봇의 성장 배경으로부터 보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정도보다도 속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동 간은 애큐러시(정확도)에 의해 매끄럽게 동작하므로 불필요하게 정도는 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손에 볼펜을 쥐고 종이에 직선을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구 한사람도 정확한 직선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그렇게 로봇은 ‘사람의 손’과 마찬가지이다. 로봇은 사람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