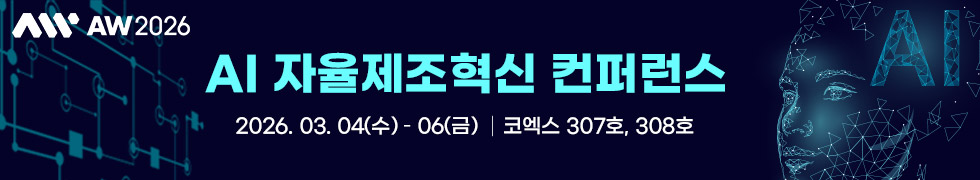로봇의 성패를 가르는 건 더 강력한 모터도, 더 빠른 연산 능력도 아니었다. 핵심은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 제도·인증, 그리고 시민이 로봇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로봇 일상화를 위해 가격을 낮추기, 제도의 문턱을 낮춰 로봇 활용도 높이기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교육과 정책 이해력(Literacy)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로봇은 결국 사회에서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도 뒤따른다.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전시장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AI로봇쇼’는 시민이 로봇을 쉽고 즐겁게 체험하고, 기업·연구자가 성과·투자·인재를 공유하는 산업 플랫폼을 결합한 자리로 주목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이 무대를 통해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선포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로봇 전문가 포럼에서는 로봇이 어떻게 인간 사회 속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탐색전이 펼쳐졌다. 좌담회 자리에서 던져진 화두는 뭘까?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로봇연구소장은 좌담회 시작 멘트에서 “로봇 연구를 생활로 번역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 기조를 반영해, 같은 날 KIST·LG전자·LGAI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케이팩스(KPEX)’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김익재 소장은 “오늘 발표자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결국 지향점은 한 곳,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사실은 모두 '로봇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공통 주제로 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로봇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성과 신뢰, 도시에서의 시험대
첫 논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였다. 데니스 홍(Dennis Hong)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꺼냈다.
“미국 자율주행 기술 업체 '웨이모(Waymo)'의 자율주행 택시는 사실 기술적으로 새롭지 않다. 하지만 익숙한 자동차라는 외형 덕분에 사람들이 더 빨리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느끼는 신뢰는 복잡한 알고리즘에서 오지 않고, 친숙함과 편리함에서 비롯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공경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로봇을 ‘구경거리’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며 “로봇이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지지를 얻으려면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안전 규제와 인증은 적이 아니라 조건”이라며, 로봇이 일상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임을 확인했다.
최리군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상무는 실제 산업 현장의 사례를 들었다. “빌딩에서 배송 로봇을 운영하면, 가장 큰 장벽은 엘리베이터 연동이다. 설계 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좋은 로봇도 비싸면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끝으로, 김상배 교수는 로봇 교육의 이슈를 꺼냈다. “데이터와 자동화의 시대일수록 오히려 이해와 통찰이 약해지고 있다. 정책 결정자부터 시민까지 정책 이해력과 로봇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특유의 의료 인프라를 언급하며 “병원을 로봇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면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과 물리, 두 엔진의 균형
연이어 토론 주제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접근’과 ‘물리 모델(Physical Model)’ 기반 접근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물리 모델은 현실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수학·물리 기반 제어 방식이다.
김상배 교수는 “최근 1~2년은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분석·제어하는 ‘데이터 드리븐(Data-driven) 일변도였다. 하지만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집중한다면, 오히려 해석력·해결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고속·정밀 영역에서 여전히 물리 기반 제어가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니스 홍 교수도 동의했다. 그는 “데이터는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도시 친화적인 로봇을 만들려면 물리 법칙을 활용한 모델링과 데이터 학습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경철 교수 역시 “로봇은 결국 물리적 존재다.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만큼 물리 기반 접근이 빠질 수 없다”며 하이브리드 접근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로봇 학습, 교육학적 프레임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좌담회 후반부에는 로봇 학습과 교육학의 접점을 탐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상배 MIT 교수는 “설명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 지식 구조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주류는 여전히 대용량 데이터 투입 방식이다. 교육학적 접근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데니스 홍 교수도 “로봇이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선 교육적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극한환경 센서, 최적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논의는 극한환경용 센서와 기술 선택으로 옮겨갔다. 최리군 상무는 “목적에 맞는 센서를 선택하고, 원가와 성능을 절충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경철 KAIST 교수도 “단순히 좋은 부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적합한 부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연구실과 현장의 관점 차이를 짚었다.
“데이터 버블을 넘어 실용성으로”
마지막으로 ‘데이터 버블(Data Bubble)’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다. 해당 현상은 앞서 언급된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데이터 양만 늘어나고 실제 가치나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김상배 교수는 “데이터는 언제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에 맞는 접근을 선택하는 메타 역량”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전에 강조한 ‘액션 랭귀지(Action Language)’ 개념을 다시 꺼내 들며, “행동에도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야 로봇의 동작을 설명하고 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로봇이 완성되는 핵심 방법론 ‘맥락’
이번 좌담회에서 “로봇은 스펙이 아니라 맥락에서 완성된다”라는 메시지가 공통으로 드러났다. 각 연사별로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연구실의 데모가 아니라 도시·산업·사회 속에서 로봇이 실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기술은 수치로 평가되기보다 사용자의 경험, 제도의 설계, 사회적 수용성 속에서 가치를 획득한다는 점을 각 연사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셈이다.
사용자 경험(UX)와 가격, 제도와 인증, 데이터와 물리, 교육과 문해력 등 요소들이 얽혀야만 로봇은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서울은 의료와 문화, 관광 인프라라는 고유 자산을 로봇 도입의 무대로 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작은 성공이 모여야 브랜드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서울에 오면 로봇이 이렇게 쓰인다’는 체험이야말로 서울이 세계 로봇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는 결론이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