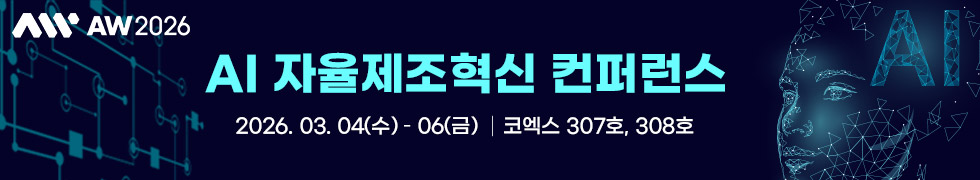현시점 인공지능(AI)·로보틱스가 연결된 혁신은 연구실의 실험이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은 산업 경쟁력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전시장 코엑스에서 열린 ‘오픈 로보틱스 AI 포럼 코리아(Open Robotics AI Forum Korea)’ 좌담회 무대는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여기서는 금융시장, 벤처캐피털(VC), 블록체인, 로봇 기업 등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로봇 혁신을 현실에 안착시키기 위한 자본·데이터·안전·오픈소스 네 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본시장의 눈으로 본 로보틱스...“투자 가능한 자산군”

브렌던 아헌(Brendan Ahern) 크레인셰어즈(KraneShares)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로보틱스를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화 전략으로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새로운 자산군(New asset class)”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지표가 절대적이다(Transparency of metrics is paramount to investors)”이라며, 하드웨어 설비 투자비(CAPEX),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을 묶어 리밸런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고, 금융 언어로 번역된 ‘투자 가능한 자산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로봇 산업이 금융의 문법을 습득해야 대규모 자본 유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다.
이팅 산(Yiting Shan) 애니모카브랜드(Animoca Brands) 투자자는 블록체인 기반 경제 모델을 꺼내 들며 로봇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그렸다. 그는 “로봇과 기계가 경제 주체가 되는 순간, 소유·사용·수익 배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게임과 웹3 영역에서 이미 검증된 토큰 인센티브 구조를 예로 들어, 동일한 원리가 로봇 협업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로봇이 기여와 보상을 주고받는 경제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봇이 ‘노동력’에서 ‘참여자’로 변모하는 전환점임을 시사했다.
예타 싱(Yetta Sing) 프리미티브(Primitive) 투자 파트너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집중해서 짚었다. 싱은 “혁신적 스토리보다 운영 데이터가 우선”이라고 언급하며, 평균고장간격(MTBF), 생산성 지표, 실제 가동률 등 수치가 자본 유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데이터로 증명된 성능이야말로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진짜 언어라는 것이다.
투자의 언어로 번역된 ‘민주화’, VC가 그리는 로봇 생태계 확산 전략은?

박준(Jun Park) 해시드(Hashed) 시니어 투자자는 “노동력이 사라지는 시대에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한국·일본 제조업의 새로운 투자 논리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산업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연결 지었다.
니할 마운더(Nihal Maunder) 판테라(Pantera) 파트너는 단기 성과 대신 인프라·표준화 같은 장기 확산 레이어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공급해야 하는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확산”이라고 피력했다.
예타 싱은 폐쇄형 모델이 만든 락인(lock-in)을 우려했다. 싱은 “폐쇄형 모델은 특정 조직의 이익을 강화하지만, 산업 전체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이어 데이터셋(Dataset)·시뮬레이션 환경 개방과 오픈 라이선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연사의 발언은 공통적으로 ‘민주화(democratization)’라는 단어에 수렴했다. 여기서 민주화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누구나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견은 오픈소스 기반의 접근성 확대와 참여의 보편화를 뜻한다. 벤처 투자자들에게 민주화는 기술이 특정 거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는 조건이자 전략적 투자 지표였다.
검증 할 수 있는 AI, 자율 시스템의 신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인가

미샤 푸티아틴(Misha Putiatin) 심바이오틱(Symbiotic)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로봇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히 결과값이 아니라 ‘행동 사슬(Chain of Actions)’로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조사나 제조 라인의 이상 탐지처럼,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추적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우마 로이(Uma Roy) 석싱크트랩스(Succinct Labs) 공동창립자 겸 CEO는 여기에 암호학적 검증 레이어를 얹었다. 로이는 암호 서명과 영지식증명(zk-proof) 기반의 로깅을 통해 “조작 불가능한 실시간 검증”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성능의 적이 아니라 경쟁력 그 자체”라고 단언했다. 즉, 안전을 위한 제약이 속도가 아니라 신뢰성·확장성으로 직결된다는 논지다.
제임스 스뉴윈(James Snewin) 아이겐랩스(Eigen Labs) 엔지니어는 이를 현장 시스템 관점에서 구체화했다. 그는 에지(Edge)·클라우드 혼합 검증 전략을 제시하며, 지연·대역폭 제약 속에서도 '실제 작동 가능한 투명성(Operational transparency)'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수준의 무거운 검증이 아니라, 공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경량 검증 체계로 번역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명의 전문가가 전한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로 모아졌다. 출력만 보는 AI 검증보다, 학습·판단·행동의 전 과정을 추적·검증·표준화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물리적 세계에 투입되는 로봇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법론이라는 것 또한 강조점이다. 결국 기존 '설명 가능한 AI(XAI)'를 넘어선, 풀스택 검증 요구로 요약된다.
모든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 온다...짚어야 할 확장의 빛과 그림자

유월터(Walter Yoo) 사하라AI(Sahara AI) 한국 지사장은 확장의 그늘을 짚었다. 그는 “확장은 곧 거버넌스 공백을 낳는다(Scale produces governance voids)”라며, 중앙집중형 AI가 만들어내는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경고했다. 기술이 커질수록 투명성과 책임 체계가 약화된다는 지적이었다.
수민(Soomin) 크로미아(Chromia) 한국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하이브리드 구조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로봇 이벤트 로그와 권한 체계를 온체인·오프체인에 분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분산원장이 로봇 활동의 기록과 권한 부여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 집중적 통제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레오나르트 돌뢰흐터(Leonard Dorlöchter) 피크(peaq) 공동창립자는 유럽에서 이미 진행 중인 ‘머신 토크나이제이션(machine tokenization)’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로봇·기계는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이 토큰을 매개로 경제 주체로 변모하는 흐름을 강조했다. 이는 로봇의 역할이 노동력에서 금융 자산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보여준다는 평가였다.
세 연사의 발언은 모든 로봇·기계가 생각할 때 발생할 새로운 거버넌스 문제와, 이를 분산·토큰화로 보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기술 확장이 책임의 확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파생되는 부분이다.
에이전트가 결제하는 시대 ‘성큼’...로봇 금융의 실험 시작되나

코니(Kony) 가이브(GAIB) CEO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직접 알아서 결제할 수 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If an agent can pay, who owns it?)”라며, 로봇·기계가 법적·경제적 행위자로 나설 때 발생하는 소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코니는 로봇 인프라를 토큰 단위로 분할·소유하는 새로운 금융 구조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로봇이 단순 자산이 아니라 분산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에디(Eddie) 에이온(AEON) CEO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장에서 암호자산 기반 결제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로봇이 실물 재화의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을 떠오르게 하며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실행 가능한 미래”라고 강조했다. 참관객이 로봇과 에이전트가 프로세스 수행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확장해,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했다.
데이비드 추(David Chiu) 타르타 랩스(Tarta Labs) 공동창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에이전트가 투자 프로필 관리까지 맡게 된다면, 자산 운용의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 결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투자 의사결정까지 로봇·기계가 개입하게 되면 금융 질서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지위, 책임 주체, 규제 체계 등 난제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술만큼이나 제도적 대비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피지컬 AI, 기계가 현실에 뿌리내릴 때

얀 리프하르트(Jan Liphardt) 오픈마인드 창립자 겸 CEO는 피지컬 AI(Physical AI)에 대해 ‘AI가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AI에 물리적 몸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이때 피지컬 AI는 AI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직접 학습·적응함으로써 실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협력하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다.
그는 우선 ‘시각·촉각·고유수용감각(Vision/Force/Proprioception)’ 통합을 통해 로봇이 물리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원(4D)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뮬레이션·현실 전이(Simulation to Reality, Sim2Real) 기법, 도메인 랜덤화(Domain Randomization)까지 구체적 경로를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 “로봇·기계를 깨어나게 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 that awakens machines)”라고 정의했다.
아트 아발(Art Abal) 바나(Vana) 공동창립자는 “데이터의 편향이 곧 로봇의 편향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참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해 모은 데이터인 ‘크라우드소싱 데이터셋(Crowdsourced Dataset)’을 내세웠다.
그는 단일 기업이나 연구소가 수집한 제한된 데이터만으로는 현실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다며, 글로벌 참여자들이 올린 데이터가 로봇 학습의 폭을 넓히는 핵심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데이터 다양성이 곧 로봇의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한다는 함의다.
아데(Ade) 서브제로랩스(Subzero Labs) 공동창립자는 “안전 레이어(Safety Layer)가 없는 피지컬 AI는 결국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알고리즘 차원의 제어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실제 하드웨어 동작 단계마다 이중·삼중의 안전 장치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릭(Eric) 그래디언트(Gradient) 창립자와 아데 창립자는 현장의 난제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두 사람은 산업 현장에 로봇을 투입할 때 부딪히는 하드웨어 표준화 부재, 이로 인한 상호운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에릭은 “서로 다른 로봇이 한 공장에서 협력하려면 표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아데는 “그러나 아직은 각 업체의 생태계가 제각각이라, 표준화 논의가 실제 적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로봇 혁신의 생존 조건’을 산업·투자·안전이라는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해 보여줬다. 금융인은 지표를, VC는 민주화를, 기술가는 투명성과 안전을 강조했다. 서로 다른 논지가 교차하며 드러난 결론은 분명했다. “로봇 혁신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제”라는 것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