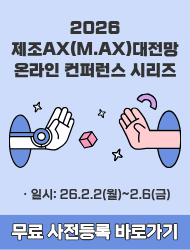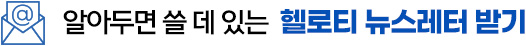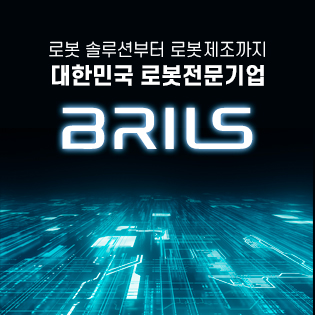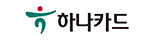최대 주주 자녀, 5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세 환급 청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가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甲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 회사는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무상증자와 2013년 10월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乙은 이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다.
2016년 11월, 甲 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 이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지나지 않아,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 이익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초 증여나 취득 시점에 이미 예견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乙이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대 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당초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세무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에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